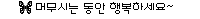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중년의 가을
‘내일이 새로울 수 없으리라는 확실한 예감에 사로잡히는 중년의 가을은 난감하다’. 왕년에는 신문에 글을 썼고, 지금은 소설을 쓰는 어느 선배 기자의 에세이에서 읽은 구절이다. 에세이를 처음 읽던 삼십 대의 나는 이 배배 꼬인 심사 앞에서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서너 해 전에 마흔 문턱을 넘어선 지금의 나는 이 구절을 주문이라도 되는양 입에 달고 산다. 아니, 단 한 하루도 이 저주와 같은 문장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어쩌면 사오십대 즈음은, 인생의 단계에서 타성이라는 낱말로 해석되는 시기인지 모른다.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는 삶, 더 이상 새로운 걸 찾지 않는 또는 찾지 못하는 삶. 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무료하고 지리멸렬한 삶. 지금의 나는 점심밥도 어제 앉았던 자리를 다시 찾아가 앉아서 먹고, 노래방에서는 신곡을 언제 눌렀는지 기억에도 없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같은 칸 같은 출입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내일은, 이제 내 남은 인생에서 멸종하고 말았다.
남들은 이 먹먹한 일상에서 벗어나려 여행을 떠난다지만, 불행히도 나는 낯선 땅에서도 타성과 맞닥뜨려야 한다. 푸르디푸르던 저 봄날의 숲도, 그 곱다는 시월 한계령의 단풍도 더 이상 내 가슴을 덥히지 못한다. 죗값치고는 혹독하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 있으려고 바둥댄다. 가장(家長)이라는 무게를 생각하면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맥 풀린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려 할 때 나는 46번 국도에 오른다. 지금처럼 늦은 가을, 늦은 저녁이면 더 좋다. 그래도 시간은 지켜야 한다. 오후 9시40분. 남이섬으로 들어가는 막배 시간이다.
|
늦가을 이른 아침. 남이섬은 물안개에 휩싸인다. 아직 사위가 희붐한 시각, 물안개 자욱한 남이섬은 낯선 장면을 연출한다. 물안개가 붉고 노란 단풍과 뒤엉켜 허공을 붉고 노랗게 분칠한다. 붉고 노란 단풍이 허공에 번져 제 윤곽을 희미하게 드러내면 어디까지가 단풍이고 어디까지가 허공인지 분간이 안 된다. 옅은 잿빛의 세상에 붉고 노란 물감을 몇 방울 떨어뜨린 듯한 풍경을 보고, 누구는 파스텔화 같다고 하고 누구는 수묵채색화 같다고 한다. 나는 한 권의 시집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 숲에 들어가 낙엽을 밟는다. 걸음을 디딜 때마다 푹푹 발목까지 들어간다.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낙엽을 밟으면 발바닥을 통해 물컹거리는 감각이 전해온다. 한없이 땅이 꺼지는 듯한 아득한 찰나다. 얼른 발바닥을 들어 무게를 옮기려 하지만, 이미 발목까지 파묻힌 뒤다. 잔뜩 긴장한 채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성가신 듯하면서도 재미있다. 낙엽이 떨어지면 부리나케 치우는 서울 시내 거리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다. 적막한 새벽 섬에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만 호수에 이는 파문 모양 사위에 울려 퍼진다.
섬 끄트머리에 있는 은행나무 길 앞에 선다. 흙길이 온통 노랗다. 노랑 융단이라도 깔아놓은 듯하다.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이어서 함부로 밟는 것조차 미안하다. 긴 숨 한 번 내쉬고 나서 두툼한 낙엽길 위에 살그머니 발을 올려놓는다.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아무도 밟지 않는 눈밭에 처음 발자국을 남겨본 적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고개를 끄덕일 터이다.
늦가을 이른 아침 남이섬은, 누구나 꿈꾸는 가을날의 미장센(mise-en-scéne:극적인 장면)을 성공리에 재현한다. 내가 이 계절이면 남이섬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는 이유다. 이제 비밀을 털어놓을 차례다. 남이섬이 풀어놓은 가을 풍경은 치밀한 연출의 결과다. 앞서 미장센이란 연극 용어를 구사한 이유다. 다들 남이섬의 자연을 말하지만, 남이섬은 자연이 빚은 선물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 하나 일구고 가꾼 산물이다.